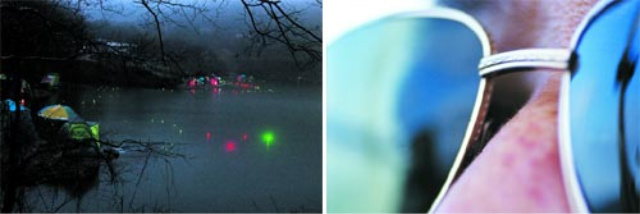- [낚시, 그들은 왜 빠져드나]
- 낚시의 3대 매력
기다림
끝없는 생각과 연구… 결코 지루할 수 없는 시간
낚시는 기다림이다.
이게 싫다면 ‘꾼’이 될 수 없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지루하다. 하지만 꾼의 기다림은 그렇지만도 않다. 무턱대고 하염없이 어신(魚信)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생각과 연구 그리고 실행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포인트는 제대로 정한 건지, 미끼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채비는 빈틈없이 정확하게 맞추었는지, 조류나 날씨 영향은 없는지 등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래서 한두 마리 잡기는커녕 찌의 움직임조차 구경하지 못한 채 잠깐 사이에 몇 시간이 지나곤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망부석처럼 앉거나 서 있는 게 아니다. 온갖 궁리를 짜내도 반응이 없다면 수면에서 눈을 거둬 사위를 둘러본다. 물에 잠긴 앞산의 풍경, 물새들의 파닥임, 저만치 하늘에 닿은 수평선…. 마음이 무한히 평화로워진다.
낚시만이 주는 정취다. 이렇게 맑은 공기와 물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 사실은 충분하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깜박 잠들어도 그만이다. 선계(仙界)를 연상시키는 산속 소류지라면 더 좋고, 갈대밭이나 푸른 소나무 아래면 더더욱 좋다. 꾼은 물과 함께 자연의 일부가 된다.
찌맛
점잖게 솟는 오색 마디… 숨소리도 시간도 멎다
기다림 끝에, 정확히 말하면 숱한 연구와 변화를 주어본 끝에 찌가 움찔거리기 시작한다.
일순간 숨이 멎는다. 온 신경이 찌에 집중되면서 저 멀리 한 점에 불과하던 찌 끝이 점점 크게 보인다. 손은 벌써 하시라도 챌 태세에 들어가 있다. 붕어가 미끼를 입에 넣고 고개를 드는 순간, 찌가 점잖게 솟으면서 오색의 마디를 하나씩 드러낸다. 바다낚시에선 갑자기 수면 아래로 빨리듯 잠겨버린다.
새삼스럽게도 이 모든 게 경이롭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꾼은 희열과 감사의 느낌을 갖는다. 이게 ‘찌맛’이다. 반응이 빠른 꾼은 시각 정보가 들어온 뒤 챔질까지 0.2~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실수도 거의 없다.
낚시는 언뜻 한가롭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순간을 다투는 싸움이다. 아니 게임이다. 일단 찌가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한 뒤로도 한참의 조바심을 참아내야 결정적 챔질의 순간을 맞게 된다. 그 고통스런 시간을 꾼들은 늘 즐겁게 이겨낸다. 그렇게 버텨낸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너무 서둘렀거나 반응이 늦어 헛챔질에 그쳤을 땐 잠시 허탈과 자탄에 빠진다. 그래도 괜찮다. 기회는 또 온다.
손맛
요란한 생명의 파닥임…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핑’. 순간반사에 의한 챔질과 함께 낚싯줄이 운다.
준·월척이라면 높은 음 피아노 소리가 난다. 귀로 먼저 전해지는 승리의 예감이다. 또한 동시에 ‘덜컥’ 손아귀로 전달돼오는 둔탁함. 이렇게 낚시의 압권 ‘손맛’이 시작된다. 요란스런 생명의 파닥임. 마지막 일합을 겨룰 순서다. 사실은 ‘진짜 게임’의 시작이다. 일단 바늘에 걸렸으니 당연히 다 끌려 나오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프로급 조사들은 꽤 가느다란 줄을 쓴다. 가급적 먼 곳으로, 혹은 바닥을 향해, 때로는 좌우로 쉭쉭 방향을 틀며 본능적으로 질주해대는 놈에게도 달아날 기회는 있다. 서툴거나 흥분한 나머지 잡는 데만 연연해 낚싯대를 무리하게 당기면 줄은 끊어진다.
놈이 달리는 방향과 힘을 보아가며 늦추거나 당기거나 방향전환을 유도하면서 천천히 힘을 빼줘야 한다. 이렇게 2~3분, 혹은 5분이나 10분, 심하면 20분 넘게 벌인 실랑이 끝에 이윽고 놈의 얼굴을 확인하고, 잠시 손아귀에 잡아 본다. 오랜 친구라도 만난 듯한 반가움과 편안함. 그리고 가만히 바늘을 빼내 놓아 준다.
성제현 붕어찌전문 일학레저 대표
'사는 이야기 > 이런저런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다 낚시 (0) | 2008.01.09 |
|---|---|
| 민물낚시 (0) | 2008.01.09 |
| 2007 대한민국 낚시계 10大뉴스 (0) | 2008.01.08 |
| 책벌레가 우글거리는 세상 (0) | 2008.01.08 |
| ‘찌맛’‘손맛’은 물론 기다림까지 즐긴다 (0) | 2008.01.08 |